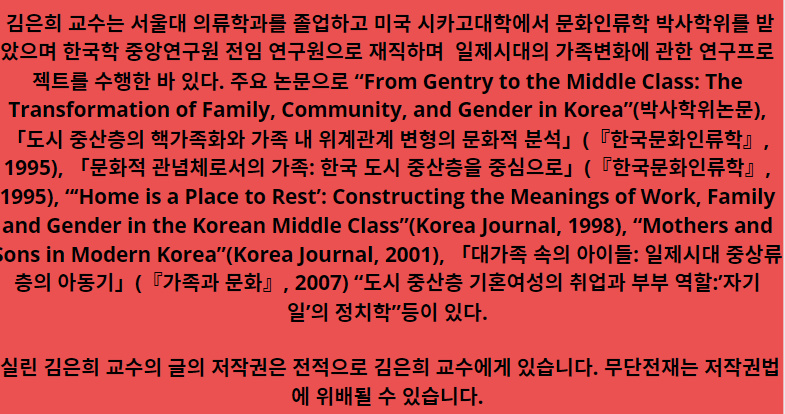당시 나는 딸아이를 가톨릭 교구에서 운영하는 작은 사립학교 7학년( 많은 미국 초등학교는 8학년까지 있다)에 입학시켰는데 가톨릭 학교끼리의 농구, 축구 등의 운동 경기가 자주 있었다. 학교가 작아 거의 모든 학생이 선수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운동을 잘 못하던 딸아이도 선수로 뛰었고 남편과 나도 학부모로서 빠지지 않고 좇아 다니면서 응원하였다.
나에게 인상깊었던 것은 선수들은 경기에 졌다고 해서 절대로 울고불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학교는 운동 경기를 진행시키는 데 있어 승부 자체보다 과정과 매너를 굉장히 중요시하였다. 게임은 양 쪽 팀 선수들이 서로 인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하였고 경기가 끝나면 진 팀이 이긴 팀을 축하해주고 선수들은 상태 팀 선수들 하나 하나와 “good job!”이라고 외치고 손뼉을 마주치며 서로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게임에서 졌을 때도 구경하던 사람들은 선수들에게 “good job!”이라고 외치며 손뼉을 마주치며 격려해주곤 하였다. 우리나라 같으면 안타깝게 지거나 하면 선수들은 울고 학부모와 선생님은 선수가 울면 달래주고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 학교에서는 선수가 울면 오히려 야단 맞았다. 한 번은 딸아이 친구였고 운동잘하던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눈에 무언가 들어가 눈을 비비고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 그것을 본 교장 선생님이 그 아이가 경기에 져서 우는 줄 알고 막 야단치는 게 아닌가! 선수가 졌다고 우는 것은 경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것이며 성숙하지 못한 자세이고 좋지 않은 매너로 보았다. 사실 그렇다. 진 사람이 울면 이긴 사람이 얼마나 머쓱하고 미안할 것인가? 우는 것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승리를 축하해주는 것이 아니다.
가끔 학생들은 심판이 공정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졌다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선수들은 때로는 경기에서 심하게 몸싸움을 하며 반칙하기도 하였다. 그렇다 하여도 경기가 끝난 후 판정에 공식적으로 시비를 거는 일은 거의 없었다. 누가 잘못했는지 애매한 경우에 일단 심판의 판정에 그닥 항의하지 않고 따랐다. 계속 억울함을 주장하는 아이가 있어도 학생들은 별로 동조하지 않고 “단지 게임일 뿐이야(It’s just a game!)” 이렇게 말하였다. 경기에 목숨이라도 걸린듯 죽자 사자 달려들어 꼭 이겨야 한다는 ‘헝그리 정신’ 같은 것은 없었다.

그런데 경기 결과에 승복하는 태도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습득되었다.
딸아이가 4학년일 때 우리 가족은 나의 미국인 절친의 집에서 머물며 그 친구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였던 적이 있다. 그 친구의 아들(‘로이’)이 딸아이(‘지원’)와 함께 무슨 게임을 하였는데 로이가 게임에서 졌다. 사실 로이가 진 것이 당연했다. 로이는 당시 만 6살 밖에 안되었으니까. 게임에서 진 로이는 짜증내며 울먹거렸다. 이 또한 내가 보기에 당연했다. 아동발달의 측면에서 6살은 아직 게임의 결과를 받아들이기엔 어린 나이였다. 나는 그래서 지원이가 초등학교 1,2학년 때까지는 게임을 하면 일부러 져주었다(물론 눈치 안채게). 지고 나면 울거나 칭얼댈 것이 뻔하니까. 그런데 지려고 해도 이길 때가 있다. 그럴 때는 달래주고 기분전환해주려고 책도 읽어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곤 하였다. 그런데 미국 부모는 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졌다고 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친구는 자기 아들을 애 방에 데리고 가서 따끔하게 야단치고 방에서 못나오게 하는 벌을 주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 어린애가 뭘 안다고 저렇게까지 야단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