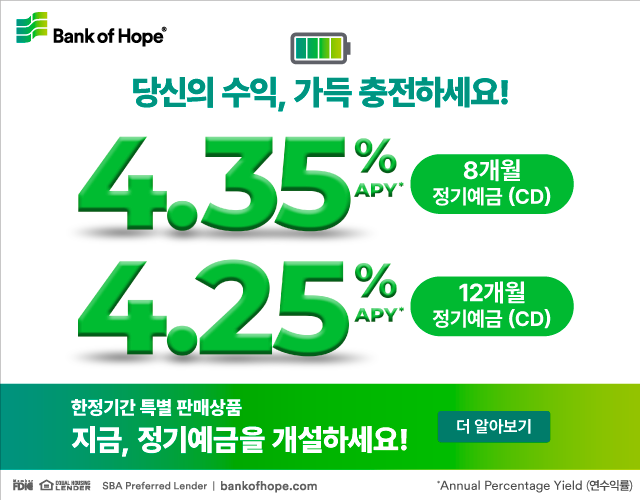도널드 레오 14세가 미국인 최초로 교황에 즉위하면서 그의 뿌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그가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 출신의 크레올(Creole) 혈통을 지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미국 사회에서 드물게 복합적 인종 정체성을 지닌 크레올 문화가 재조명되고 있다.
11일 뉴욕타임스(NYT)는 레오 14세의 외가가 뉴올리언스의 혼혈 공동체, 이른바 크레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레올 혈통을 연구해온 계보학자 재리 호노라는 공문서와 교회 기록을 토대로 레오 14세의 외조부모가 각각 ‘물라토(흑백 혼혈)’ 또는 ‘흑인’으로 분류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1887년 뉴올리언스의 한 성당에서 혼인한 레오 14세의 외조부모는 1910년대 초 시카고로 이주해 그의 모친인 밀드리드 마르티네스를 낳았고, 레오 14세는 그 시카고에서 태어났다. 겉으로 백인으로 분류되었지만, 그 가족의 뿌리는 명백히 흑인 커뮤니티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미국 내 전통적인 인종 구분 관념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뉴올리언스의 크레올은 유럽계와 아프리카계, 원주민의 피가 섞인 공동체로, 루이지애나가 프랑스·스페인 식민지였던 시기에 생겨났다.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카톨릭을 믿으며, 백인처럼 보이는 피부색을 가진 사람도 적지 않았다. 특히 다른 남부 흑인과 달리 노예제가 폐지되기 전에도 자유 신분인 경우가 많았고, 교육 수준과 사회적 지위도 높았다.
그러나 미국 전체가 인종을 백인과 흑인이라는 이분법으로 구분하면서, 크레올은 어느 범주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이질적인 존재로 취급받았다. 20세기 초중반 짐 크로법 체제 아래서도 뉴올리언스의 크레올들은 때로는 백인과 어울려 살기도 했지만, 인종 분리를 강요하는 법과 제도는 이들의 정체성마저 분열시켰다.
실제로 많은 크레올들이 시카고, 캘리포니아 등지로 이주하면서 기존 지역사회의 인종 분류 체계를 따를 수밖에 없었고, 외형이나 성씨에 따라 히스패닉, 백인, 원주민, 아시아계로 분류되기도 했다.
“사진 한 장에 정체성 바뀌어”…숨겨진 크레올의 역사
뉴올리언스에서 백인으로 살아온 이들이 나중에 자신의 조상이 흑인 크레올이었음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미네소타에 사는 마크 루데인(73)은 선친이 남긴 사진첩을 통해 고조부가 뉴올리언스에서 활동했던 흑인 의사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그의 아버지는 이 사실을 숨긴 채 백인으로 분류돼 툴레인대학을 졸업하고 백인 사회로 편입되었다.
레오 14세 역시 외형상 백인으로 보이지만, 그의 외가가 흑인 혼혈이라는 사실은 그가 가진 복합적 문화적 배경을 설명해준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족보를 넘어서 미국 사회가 ‘흑백’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역사와 정체성을 품고 있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뉴올리언스는 전혀 다른 세계”
자신을 크레올로 밝힌 웬디 고딘 자비에대학 교수는 “뉴올리언스는 인종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전혀 다른 세계”라며, “미국의 전통적 분류에선 배제됐던 수많은 이야기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레오 14세의 즉위는 단순히 미국 출신 첫 교황이라는 의미를 넘어, 미국 인종사 속에 감춰졌던 크레올의 다층적인 정체성과 역사적 맥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이 보아왔던 인종의 경계선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