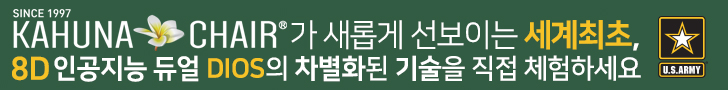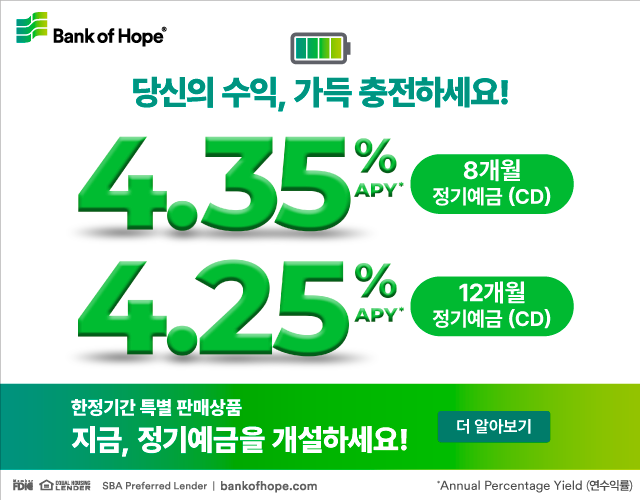‘억울함’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소비되는 감정이다.
‘억울함’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흔하게 소비되는 감정이다.
정치인도, 연예인도, 대기업 CEO도, 심지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조차 “나는 억울하다”는 말로 방어막을 친다. 이재명과 백종원, 정치와 음식이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두 인물이지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 만들어낸 ‘억울함’의 서사를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닮아가고 있다.
이재명은 “나는 흙수저였다”는 이야기를 정치적 정당성의 뿌리로 삼는다.
공장에서 일하며 검정고시와 사법시험을 거쳐 인권변호사가 됐다는 인생사를 반복하며, 스스로를 ‘기득권에 맞서는 서민의 대변자’로 포장해왔다. 하지만 정작 그의 정치 인생은 측근에게 수천억대 이익이 흘러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긴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 스캔들로 얼룩져 있다.
더욱이 이재명은 이를 정당화하려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고, 이에 대해 2025년 5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로 형사처벌 전력은 이제 전과 5범에 이른다. 그럼에도 그는 말한다. “나는 정치 검찰에게 탄압받는 억울한 희생자”라고.
백종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억울함’을 방어막으로 사용한다.
최근 ‘트루맛쇼’ 감독 출신 유튜버와의 공항 인터뷰에서 그는 “나는 억울하다. 억울해도 가만히 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농약통 쥬스 분무기” 논란에 대해서는 “그 통은 새 제품이고 농약을 한 번도 담은 적 없는 통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백종원 본인은 자영업자들에게 위생을 철저히 강조하며 방송에서 “저런 식이면 망합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다”고 꾸짖던 당사자였다. 그런 그가 자신이 주도한 지역 축제에서 수차례 비위생적인 조리 장면을 연출한 것은, 사실상 자신의 기준을 스스로 배신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남용, 과도한 축제 비용 문제다.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프로젝트였지만, 정작 지자체 예산 수억 원이 백종원 측에 집중되었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었는지는 끝내 불투명하다. 상생을 외치며 등장한 백종원이, 상생의 비용을 지역사회에 전가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둘 다 비판은 곧 ‘마녀사냥’이고, 책임 추궁은 ‘기득권의 탄압’이며, 지지자들은 ‘무비판적 충성’으로 이들을 감싼다. 그리고 이 구조를 통해 오히려 비판자들을 공격하는 힘이 만들어진다. 그들은 죄를 묻는 대신, 억울함을 공유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로 결집한다.
이재명의 팬덤은 ‘검찰 독재 타도’를 외치며 진실 대신 음모를 이야기하고, 백종원의 팬덤은 ‘방송의 미덕’을 강조하며 사실 대신 이미지에 의존한다.
그런데 정말 억울한 사람은 누구인가?
표를 왜곡당한 유권자일 수도 있고, 자영업자의 이름만 빌려 소비된 지역민일 수도 있다. ‘억울하다’는 말이 반복될수록, 책임져야 할 자들이 면죄부를 얻고, 고통을 겪는 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지워진다.
‘억울하다’는 말이 마치 정의처럼 사용될 때, 우리는 한 번 더 의심해야 한다. 그 말의 이면에는 책임 회피와 이미지 정치가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백종원, 서로 다른 분야지만 놀랍도록 닮은 이들의 ‘억울함의 정치학’은 우리 사회의 집단 심리를 비추는 데칼코마니다.
그림자는 닮았지만, 실체는 정면으로 바라봐야 한다.
<김상목 기자>
관련기사 [이런일도] 이재명은 되고, 백종원은 안 되나 … 팬덤 백종원만 억울